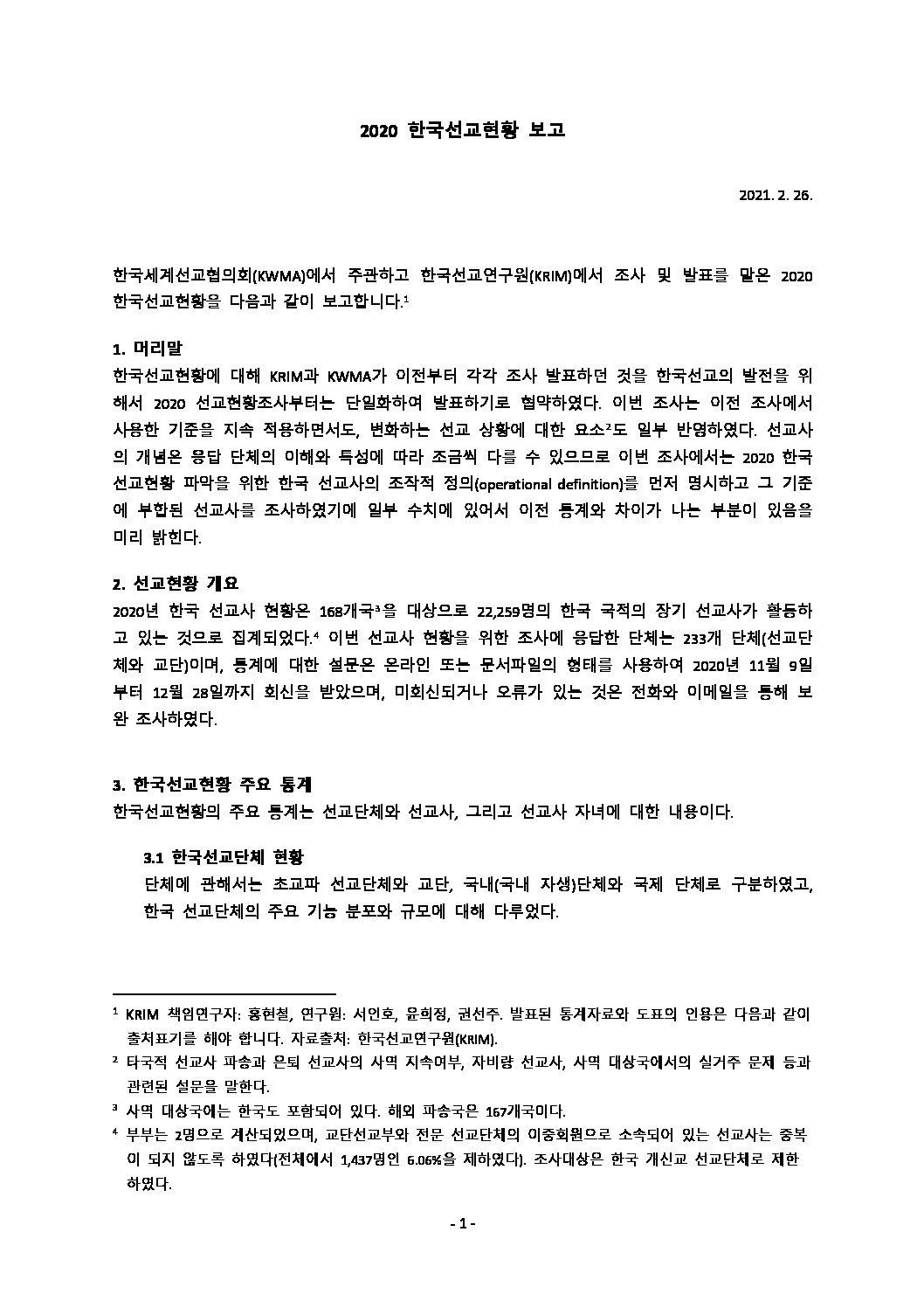|
ㆍ무르시 축출 후 최대 사망자
ㆍ튀니지선 야권지도자 피살… 리비아, 소요 속 대규모 탈옥
ㆍ이슬람주의 득세 아랍국들 민주주의 경험 부족에 ‘진통’
짧은 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온 것일까.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혁명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축출한 아랍국들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래 계속되는 시위가 대규모 유혈사태로 이어지면서 이집트가 중대 기로에 섰다. 무르시 지지자들이 ‘라바아 학살’로 규정한 유혈사태는 27일 새벽 일어났다. 무르시 지지자들은 지난 3일부터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모스크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왔다.
무르시의 지지기반인 이슬람 조직 무슬림형제단 대변인은 진압병력이 시위대의 목숨을 빼앗으려 조준 사격을 했다면서 “숨진 이들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11세 소년이 목에 총상을 입고 숨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피에 젖은 수의에 덮인 수십 구의 시신 사진들을 올렸다. 보건부는 이날 진압으로 72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알자지라방송은 최소 120명이 숨지고 450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28일에도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사망자가 속출, 이틀 새 20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슬림형제단은 “비인도적인 학살은 쿠데타에 맞서는 결의를 단단하게 할 뿐”이라며 전국에서 군부 반대 집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무슬림형제단과 반대편에 서 있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과도정부 부통령도 “공권력 남용”이라며 우회적으로 군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반면 당국은 실탄 발포를 부인했다. 내무부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려 최루탄을 썼을 뿐”이라며 폭력사태를 조장한 것은 무슬림형제단이라고 비난했다. 여러 세력이 연합해 꾸려진 과도정부는 정국 혼란에 속수무책이고, 사실상의 권력기관인 군부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리비아에선 27일 대규모 반정부·반이슬람주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슬람 진영을 비판해온 변호사 압둘살람 알 무스마리가 전날 피살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제2도시 벵가지 부근 교도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1200여명이 탈옥했다. 탈옥한 수감자들 중에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잔당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니지에선 지난 2월 과격 무슬림을 비판하던 좌파 야권 지도자가 피살된 데 이어, 지난 25일 세속주의 성향 야당 정치인 무함마드 브라흐미가 괴한들의 총격에 살해됐다.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인 살라피스트가 암살 배후로 지목됐다. 야권은 집권 엔나흐당이 이슬람주의자들로 정부를 구성하고 살라피스트들의 폭력을 방관한다며 비판해왔다.
‘아랍의 봄’은 이렇게 혼란과 유혈사태로 굴절되고 있다. 민주화 혁명으로 자유선거가 실시된 이들 나라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슬람주의의 득세와 이에 대한 반발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주선거가 실시되자 그 최대 수혜자는 이슬람 세력이 됐다. 오랜 독재 기간 대안세력이 소멸된 탓에, 유일하게 조직력을 갖춘 이슬람주의 진영이 혁명의 열매를 독점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고, 통치 경험이 없는 탓에 시급한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했다. 결국 이에 반발한 세속주의 세력과 독재 잔존 세력이 손잡고 이슬람주의 정권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 겨우 봄을 맛본 아랍국들이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진통을 상당 기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