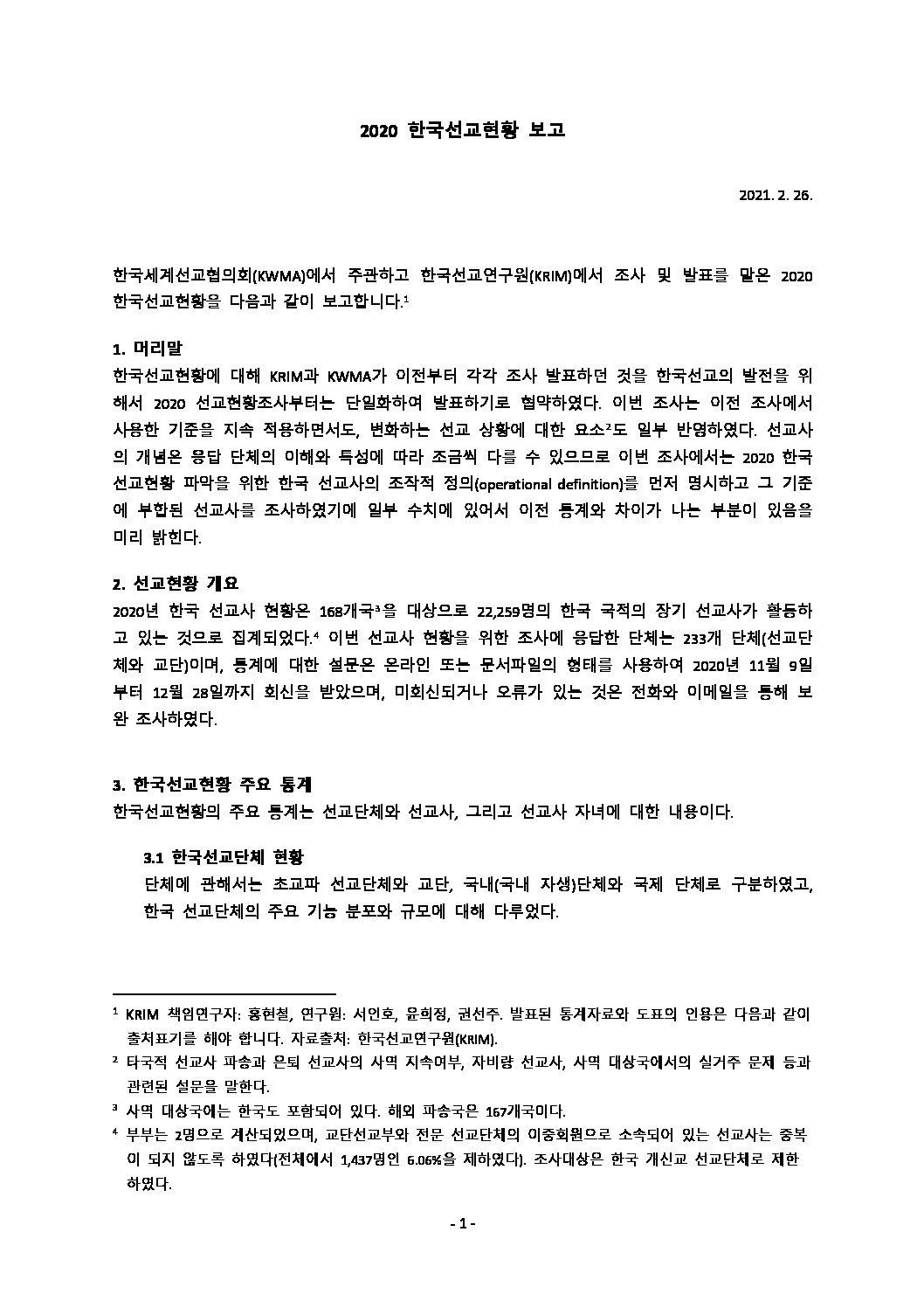ㆍ생존자들이 말하는 제노사이드
ㆍ“지워지지 않는 상처… 이때만 되면 고통 되살아나”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140㎞ 떨어진 키붕고주(州)의 냐루부예 마을. 1994년 4월15일과 16일 이 마을에서는 ‘냐루부예 학살’이라 이름붙은 유혈참사가 벌어졌다. 마을 교회에 피신한 툿시(투치)족 1500여명이 후투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일대에서만 3만50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교회 옆에 지어진 학살기념관에는 유골 더미가 전시돼 있다.
냐루부예 광장에 지난달 28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어른도 있고, 아직 스무살이 안된 아이들도 있었다. 주민 수천명은 숙연한 표정으로 광장에 도착한 횃불을 맞이했다. 전국을 거쳐 봉송된 추모 횃불이 이날 냐루부예에 온 것이다. 제노사이드 20년을 맞아 르완다에서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화해’를 강조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테오피스테 무카노헬리는 냐루부예 학살 때 18세 소녀였다. 28일 주민들 앞에 나온 그는 “교회 안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저들이 교회 안으로 수류탄을 던졌고, 가족 대부분이 그 공격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집 사람이 땅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시신들을 묻었다”며 그날의 충격을 전했다. 다행히 그 후 20년간 종족 간의 충돌은 거의 없었으며,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냐루부예 학살의 또 다른 생존자 마이크 응쿠주무와미는 AP통신에 “그 뒤로는 아무도 부족을 구분해서 부르지 않으며, 공격에 가담했던 후투족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나 일리자라는 여성은 르완다 학살을 다룬 영화 <천 개의 언덕>에서 이름을 따온 시민단체를 만들어, 학살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미국 허핑턴포스트 기고에서 “20년 전 어머니는 군인들에게 애원해 나를 살린 대신 목숨을 잃었다”며 “해마다 4월이면 주변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말자’며 페이스북에 촛불이나 추모 사진을 올리지만 오히려 나는 이때만 되면 그 기억을 잊자고 다짐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싸우며 내가 느낀 것은,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나감으로써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